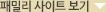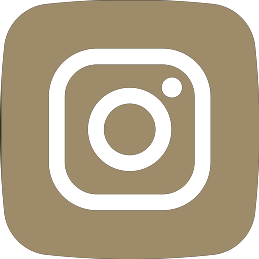자료실
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의 과거사업에 대해 만나보세요.
| [영화속 장애인 이야기-남경욱] 도망치고 싶었던 영화 <Even Dwarfs Started Small> | |
|---|---|
| 사업영역 | [활성] 장애인식개선사업 > [활성] 칼럼/에세이 |
| 등록일 | 2020-07-16 오전 10:23:18 |
|
도망치고 싶었던 영화
남경욱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연구교수
인터넷에서 장애관련 영화를 찾던 중 독일 영화계의 거장 감독 베르너 헤어조크의 1971년도 영화 한 편을 발견하였다. 국내 영화 사이트들에서는 영어 원제를 그대로 살려 <난쟁이도 작게 시작했다>로 소개하고 있다. 40년이 넘은 영화, 그것도 흑백영화라는 점이 묘한 흥미를 갖게 만들었다.
적어도 내게 있어서 흑백영화라면 찰리 채플린의 빛나는 명작 <모던 타임즈(1936)> 혹은 아련한 트럼펫의 여운을 남긴 안소니 퀸의 <길(1954)>과 같은 작품들이 먼저 떠오르고, 비교적 근래작으로 리암 니슨이 열연한 <쉰들러 리스트(1994)>가 떠오른다. 모두 영화사에 길이 남을 작품이 아니던가! 생소한 제목의 이 영화를 처음 발견했을 때 위의 영화들을 떠올리며 실망스럽지 않을 거라는 조금은 근거없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적막감이 흐르는 한 방에서 영화는 시작된다. 체포된 듯 보이는 한 난쟁이가 죄수들이 드는 번호판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그러면서 취조하는 목소리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영화의 나머지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연 어떤 충격적인 그리고 심오한 사건이 벌어졌을까?
어느 시설의 소장이 외출한 틈을 타 그 곳에 수용되어 있는 십여 명의 난쟁이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시설에 남아있던 감독관(역시 난쟁이)은 한 난쟁이를 인질로 잡고 건물 문을 걸어 잠근 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려 하지만 전화선은 이미 절단된 상태이다. 난쟁이들은 돌을 던지며 겁을 주고 자기들 세상이 된 시설의 앞마당에서 난장판을 피우기 시작한다. 처음엔 감독관의 집에 침입해 장난을 치며 억울했던 심정들을 표출하고 그간 못해본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는 정도이지만 그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진다. 시설을 향한 돌팔매질 다음에는 소장이 가장 아끼는 나무를 뽑아버리고 그 시설에 살고 있는 맹인 난쟁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더니 결국 정도의 끝이 어딜지 모를 행동들을 보여준다. 어미 돼지를 죽이고 자동차를 파괴하고 모든 화분에 불을 지르더니 원숭이를 십자가에 메달고 행진하는 불경스런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다.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인터넷 포스팅들을 살펴보면 난쟁이들은 우리 인간의 추악한 본성이 묘사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왜 출연진을 난쟁이로 선택했을까? 인간의 수준낮음을 그들의 키에 비유한 것이 아닐까 싶다. 영화를 보는 내내 난쟁이들은 징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절제되지 않은 파괴적 행동과 말초적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조롱하며 즐기는 가학적 모습을 보인다.
그게 다가 아니다. 영화 초반부터 카메라 렌즈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닭, 쥐, 돼지의 시신을 보는 것이 힘겨운 판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영화 전체에 걸쳐 듣기 괴로운 노래소리를 깔고 있다. 바로 이런 것이 시청각 고문(?)일 것이다. 한마디로 정신적 테러를 당한 느낌이다.
불의의 일격을 당하고 보니 우리가 왜 영화라는 것을 보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하기에 이르렀다. 필시 즐거움이 먼저일 것이고 감동, 교훈, 위안 등이 보너스로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그 기대를 산산조각내주고 있음은 물론 영화 이면의 숨은 뜻을 살피는 작업이 싫어질 정도이다. 하지만 휴식 뒤 차분히 생각해 보았다.
현상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보이기 마련이다. 인간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름다운지 추한지의 판단 역시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의 문제이다. 필자의 추측에는 감독이 일반 대중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나 불합리한 현실의 피해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억울함을 우리들에게 호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감독은 ‘현실에서 당신이 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마!’하고 도전하는 것 같다.
사실 감독은 난쟁이들의 반란이유를 친절히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다만 영화에 등장하는 소품들을 통해 난쟁이들이 거주하는 곳인데도 침대가 너무 높아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술병은 너무 커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볼 따름이다.
또한 제목처럼 처음엔 작게 시작했던 그들의 행동이 나중에는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만큼 심각해진 것을 보며 역사 속에서 대중이 그들보다 불리한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작게 시작했던 횡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지금은 너무 커져버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폭력이 왜 없겠는가? 장애관련 역사에서 자본주의와 함께 장애인들을 사회에서 체계적으로 배제시켜온 그것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독일 거장 감독의 1970년대 흑백영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보게 된 이 영화로 인해 필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과연 인간의 본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작게 시작해지만 지금은 너무나 커져버린 비인간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음에는 조금 밝은 영화를 택해서 보겠노라고 다짐해본다. 끝으로 이 영화에 호기심이 생긴 독자가 있다면 마음 단단히 먹고 보기를 미리 귀뜸해주고 싶다.
* 난쟁이라는 용어를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기형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 되어 있다. 그러나 영화에서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의미전달상 적절할 것으로 보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
|